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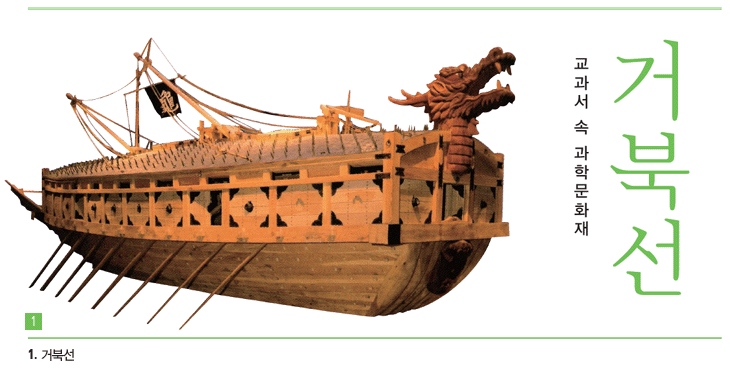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는다면 무엇 무엇을 들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극적이고 참혹했던 경우는 분명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8)이었다. 그 비극적 전란에서 그나마 우리를 위로해 주는 한 가지가 거북선(龜船)이다. 그리고 거북선이라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은 거북선을 자랑하고, 그것을 앞세워 일본 해군을 물리친 이순신을 성웅(聖雄 : 성스러운 위대한 영웅)으로 높였다. 1920년대에 시작된 이순신과 거북선 예찬은 광복 이후 더욱 성행하여 오늘에 이른다.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 소설가 이광수(李光洙, 1892~1950)는 1931~32년 <동아일보>에 소설 “이순신”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당시에는 거북선을 정말로 대단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시의 잡지 <삼천리> 1930년 11월호를 보면 거북선은 잠수함의 시조이며 1862년 미국 남북전쟁에 처음 사용되었다는 철갑선(鐵甲船)보다 270년 앞선 철갑선이었다고까지 자랑하고 있다.
좀 지나친 자랑이었다. 거북선은 분명 잠수함은 아니었고, 철갑선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장보고(張保皐, ?~846) 이래 바다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무역의 중요한 방식이기도 했다. 또 고려 태조 왕건(王建, 847~918)은 서해 연안을 따라 전라도 지방까지 왕래하며 호족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세력을 키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다. 당연히 그는 해상활동에 익숙한 인물이었고, 그 덕택에 새 왕조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하겠다. 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서 해안을 따라 거둬들인 곡식을 서울(고려 때는 개성)로 운반하는 데 배의 역할이 절대로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곡식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을 거둬들여 각 지방에서 서울로 운반해 서울의 관리들에게 녹봉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운반하는 배가 발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대표격인 배가 조선 초기에 발달한 판옥선(板屋船)이다. 원래 조선 초의 대표적인 선박은 맹선(猛船)이었다. 평상시에는 조세로 거둬들인 곡물이나 특산품을 서울로 실어나는 조운(漕運)에 사용되었으나, 전투에도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맹선은 갑판이 1층뿐이고 바닥은 평평한 평저선(平底船)인데, 판옥선은 그 위에 한 층을 더 올려 2층 구조로 만든 배다.
노꾼(櫓軍)들이 상하 갑판 사이의 안전한 장소에서 노를 젓고, 군사들은 위층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 적이 접근하여 배에 뛰어들기 어렵게 판옥선에 지붕을 덮은 것이 거북선이다. 그 위에는 십자로 길을 내어 놓았고, 칼과 송곳을 꽂아 적이 기어올라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앞에는 용의 머리를 달았고 그 입에는 총구멍을 만들고 뒤에는 거북의 꼬리를 달았다. 명칭만으로는 거북선이 처음 기록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 초 1413년(태종 13)이지만, 그것이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 그것이 차츰 개량되어 임진란 때에는 크게 활약했고, 그 덕분에 우리 역사에 유명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거북선이 임진왜란 초기에는 세 척뿐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후 18세기에 가서 14척 그리고 나중에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거북선의 승선 인원은 150명 정도였고, 그 가운데 노꾼이 80~90명이었다. 조선 시대의 배는 모두가 평저선이어서 바닥이 평평한 모양이었다. 서양에서는 바닥을 뾰족하게 만든 첨저형(尖底型) 선박이 발달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배가 발달하지 않았다. 해안선이 아주 복잡하고 간만의 차가 아주 심한 우리 연안에서는 속도를 내는 배보다는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배가 더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서남해안같이 섬이 많고 물길이 자주 변하는 해역에서는 평저선이 첨저선보다 오히려 항해에 유리한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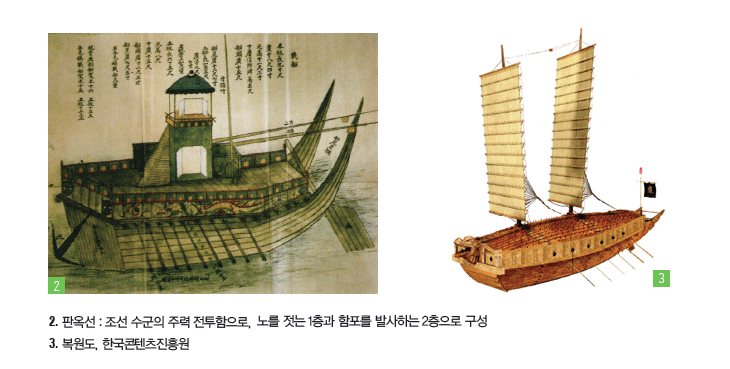
임진년 왜군이 침략해 들어오자 1592년 5월 4일 옥포(玉浦)해전이 이순신 최초의 큰 승리였다. 이 싸움을 시작으로 이순신은 한산(閑山)대첩을 거쳐 그가 전사한 명량(鳴梁)대첩까지 23전 23승의 놀라운 연속 승전의 기록을 보여준다. 이 승전에 크게 그 몫을 한 것이 바로 거북선이었다. 비록 속도는 월등하지 않았고 겨우 세 척밖에 없었다지만, 거북선은 처음 그런 배를 보게 된 왜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다. 왜란 이후 일본 기록이 그들이 느꼈던 공포감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거북선에 대해서는 70년대 이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선 그것은 잠수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제 강점기 때 잠수함이라 설명한 글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었다. 또 그것이 쇠로 지붕을 덮은 철갑선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철갑선은 아니었으나 나무판 뚜껑을 쇠붙이처럼 칠해 적군에게는 철갑이라도 두른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197년 뒤인 1795년에 편찬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는 이순신의 시문집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거북선의 모양을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그린 그림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러 차례 남해안 여기저기를 탐사했으나 거북선의 흔적을 건져낸 적도 없다. 지금도 거북선의 복원은 상당 부분 오늘날의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림짐작의 결과라 할 수 있어서 복원품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모양을 하기가 일쑤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거북선을 발명한 사람은 이순신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순신보다는 그의 아래에 있던 나대용(羅大用, 1556~1612) 장군의 발명이란 주장도 있다. 아마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이미 있었던 뚜껑 덮은 배, 즉 거북선이 거의 잊혀져가다가 임진란 때 복구되었고, 그 과정에 이순신과 나대용의 공헌이 있었을 수도 있을 듯하다. 하기는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특히 이순신이 서울로 압송되자 1597년 1월 경상우수사 겸 경상도통제사로 임명되었으나, 칠천량(漆川梁)에서 대패하고 전사했던 원균(元均, 1540~97)을 재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거북선은 통영, 사천, 여수 등에는 바다 위에 직접 그 위용을 보이고 있는 복제품도 있고,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이나 기념관에도 그 모형은 전시되고 있다. 그뿐인가? 기념품으로 크고 작은 거북선이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어서 전국, 아니 세계에 우리 거북선은 아주 널리 퍼져 있다. 아직도 그 전체 모습을 확연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북선은 임진왜란 극복에 크게 공헌한 우리의 발명품이었고, 자랑스러운 민족유산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관련교육과정 :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글˚박성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