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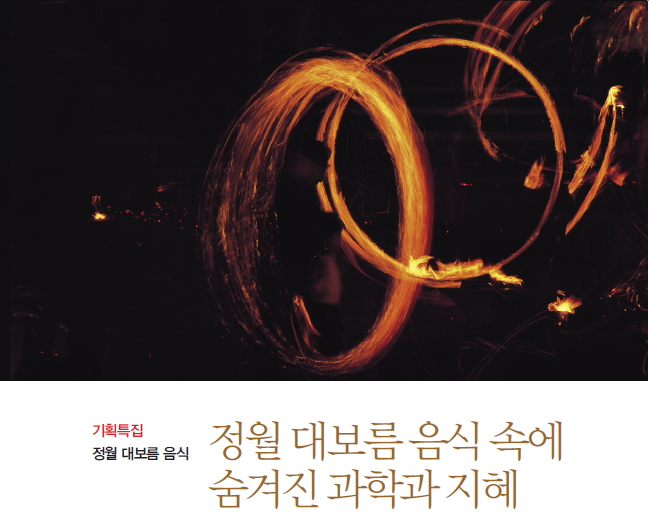
대보름 또 하나의 명절
설날이 지나고 어린아이들의 세뱃돈이 가벼워질 때면 달은 점점 살이 올라 둥그레지며 환하게 웃는다. 또 하나의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때쯤 되면 집집마다 부산해지기 마련인데 남자들은 달집태우기를 할 대나무와 나뭇가지들을 모으기 바쁘며 여자들은 오곡밥과 진채식(진채, 묵은나물)을 준비하기 위해 나물들을 삶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준비한 부럼에 손을 내밀다가 야단맞기도 하며 쥐불놀이에 사용할 깡통을 구해다가 누가 더 불이 더 밝게 보일지 내기하며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 드디어 대보름날 아침이 되면 이불 속에서 부럼을 깨무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골목에는 오곡밥의 구수한 냄새와 진채식을 볶을 때 나는 참기름과 들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진채식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맑은장국과 함께 진채식을 먹었는데 진채식은 지난가을에 손질하여 말려 두었던 취나물, 토란잎, 배춧잎, 피마자잎, 호박고지, 박고지, 말린 가지, 말린 버섯, 고사리,고비, 도라지, 시래기, 고구마순 등의 나물들을 물에 담가 우려낸 다음 삶아서 집간장과 다진 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간이 배게 조물조물 주물러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아먹었다. 이것은 겨울철에 채소 섭취가 용이하지 않았던 시절에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섭취를 할 수 있는 선조들의 훌륭한 지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박나물, 버섯 등을 말린 것과 대두황권, 순무, 무 등을 묵혀둔다. 이것을 진채(陣菜)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진채식을 먹으면 그 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호박고지는 비타민D가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좋으며, 박고지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동의보감>에서는 박이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한다고 하였으며, 칼슘·철·인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에 좋은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사리는 해독과 해열 효능이 있고, 식이섬유가가 많아 변비에도 좋은 음식이며, 시래기는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취나물은 기침과 가래에 좋은 효과가 있고, 도라지는 사포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을 높여주고, 고구마순은 비타민이 풍부하다. 이렇듯 묵은 나물은 생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겨울철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공급해 주는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복쌈
상 위의 진채식 옆에는 복쌈이 자리 잡고 있는데 복쌈은 대보름 절식의 하나로 김이나 배춧잎, 취, 아주까리잎 등 넓은 잎에 밥을 싸서 먹는 행위로 복을 싸서 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밥상에서 큰 입을 벌려 쌈을 싸서 먹는 손주나 자식들을 보고 어른들은 ‘큰 쌈을 먹으니 큰 복이 들어가겠다’하시며 덕담을 잊지 않았고 이것은 농경사회 속의 복을 기원하는 기복(祈福)과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기풍(祈豊)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배춧잎과 김으로 밥을 싸서 먹는다고 하여 ‘복과’라 하였으며, 『렬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김에다 참취 등속을 싸서 먹되 많이 먹어야 좋다 하며 ‘박점’이라 하였다.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바라는 마음은 김쌈을 볏섬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에서는 찹쌀로 백반을 해서 김에 싸먹으며 이것을 복쌈 또는 볏섬이라 하고,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서는 보름날 아침에 흰밥을 지어 김쌈을 볏섬으로 여겨 많이 먹으면 농사에 장원을 한다고 여기고, 충남 천안시 병산면에서는 김쌈을 많이 먹으면 볏섬을 많이 한다고 하며, 충남 부여군 온산면과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는 볏섬이 김쌈을 하나 먹을 때마다 쌓아진다고 여기며 김쌈을 먹는다. 또한 노적 쌓기라 하여 전북 전주시에서는 찰밥을 김에 쌓아 놓고 ‘노적밥’이라 부르고 전북 고창에서는 오곡밥을 김에 싸서 장독대에 올려놓고 ‘노적쌈’이라 부르며, 전남 장성군에서는 보름날 아침에 김쌈을 하여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으며 이것을 ‘노적쌈’이라 부른다. 전남 장흥군 장흥면에서는 오곡밥을 김에 싸서 낟가리와 광 등에 놓고 ‘노적’이라 하였으며,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는 대보름날 찰밥으로 김쌈을 하여 차례상과 성주·쌀독 등에 놓고 노적 쌓기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하는 기풍의식(祈豊儀式)인 것이다.
원소병
오곡밥에 복쌈과 진채를 먹고 나서 마시는 꿀물 안에 구슬이 담겨 있는 듯한 원소병이란 음료는 원소병수단이라고도 하며 찹쌀가루를 익반죽한 후 대추를 거른 소를 넣고 둥글게 경단을 빚어 녹말가루를 입혀 물에 담갔다가 다시 녹말가루를 입히기를 반복하여 삶아서 꿀물이나 오미자를 우린 물을 붓고 잣을 띄워 먹는 음료이다. 원소병의 유래로는 『규합총서(閨閤叢書)』에 북경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원소(元宵)라 하는데 정월대보름날에 달을 보며 먹는 떡이라 하여 원소병(元宵餠)이라 하였다고하고,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의하면 중국 삼국시대의 원소(袁紹)가 즐겨 만들어 먹던 떡이라 하여 원소병(袁紹餠)이라 하였다고 하며, 작고 동그란 떡이라 하여 원소병(圓小餠)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옛 문헌을 보면 만드는 법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규합총서』에서는 ‘찹쌀가루에 날반죽을 하여 호두, 후추, 잣, 사탕, 계피를 다져서 섞어 소를 만들어 만두모양으로 빚어서 삶아 사탕가루를 묻혀 꿀을 탄 오미자물에 넣어 먹는다’ 라고 했고,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는 ‘찹쌀가루 반죽에 대추를 쪄서 내린 것을 소로 넣어 경단을 빚어 사탕물에 삶아 먹는다’라고 했다.
또한 『조선요리제법(조선料理製法)』에는 ‘찹쌀가루를 고운체로 쳐서 익반죽해 놓고, 청매와 귤병을 잘게 썰고 계핏가루와 설탕을 넣고 섞어서 소를 만든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원소병에 들어가는 소의 재료와 모양이 조금씩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는 소에도 견과류와 대추, 유자청, 계핏가루를 넣어 맛과 영양을 추구하는 원소병이 재탄생하고 있다. 이렇듯 정월대보름의 식문화를 통해서 우리민족은 농경생활을 하면서 달과 밀접한 생활을 해왔고 전통적 세시풍속을 통하여 이웃과 정이 넘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의 밝음으로 자연의 밝음을 잃어가는 현 세대에 이웃과 정을 나누는 정월 대보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전순주(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과 학과장)-


















